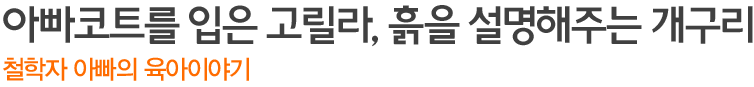아이에게 하루에 다섯 권씩 책을 읽어주기로 했다.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은 아이의 자유다. 읽을 책을 골라서 가져오라 하면 아이는 책장 앞으로 달려가 사탕가게에서 사탕을 고르듯이 신중하게 책을 고른다. 보통은 현대작가들이 만든 그림책 한 권, <인어공주>와 같은 명작 동화책 한 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동물 책이나 자연과학 그림책을 챙겨온다. 내 아이는 특히 모 윌렘스의 책을 좋아한다. <내 토끼 어딨어?>(모 윌렘스)에서 토끼 인형을 사랑하는 트릭시는 키티 인형을 좋아하는 내 아이와 닮았다. 네델란드의 할아버지 댁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트릭시를 보면서 내 아이도 유학 중이던 엄마를 만나러 뉴욕에 다녀온 일을 떠올렸다. 세 살 때 일이라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책이 열 네 시간 여의 끔찍한 비행기 여행을 다시 생각나게 한 것이다.
모 윌렘스의 이야기가 일상에서의 소소한 공감으로 웃음을 주는 이야기라면, 앤소니 브라운의 이야기는 좀 더 시적인 편이다. <고릴라>(앤서니 브라운)는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가서 고릴라를 보고 싶어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현실과 환상이 교차되고 있다. 아빠의 코트를 입은 고릴라 인형이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바쁜 아빠를 대신해 함께 동물원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춤도 춘다. 왜 이 고릴라는 아빠의 코트를 입고, 아빠의 모자를 쓴 것일까? ‘아빠의 코트를 입은 고릴라’는 어쩌면 고릴라가 아니라 아빠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전에 아이는 “고릴라 인형이 왜 살아 움직여?”라고 묻는다. 고릴라가 아빠의 코트를 입고 있다는 사실보다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있다는 점이 그저 신기한 것이다. 아이는 이 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빠 코트를 입은 고릴라는 사실 이야기 속의 아이가 바라는 아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이는 이해할 수 있을까?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만드는 책은 동화책보다도 이해해야 할 내용이 많다. 어제 읽었던 <엉망진창 흙>은 토양에 대한 책이다. 흙의 종류가 10만 가지가 넘는다는 사실, 토양은 부식토를 시작으로 깊이 파들어 갈수록 표토, 심토, 모암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다. 이런 내용을 일곱 살 아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조바심이 나서 아이에게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되물었다. “흙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 했지?”, “부식토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얼마 전 <이글이글 태양>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흑점이 뭐라고 했지?”, “자동차를 타고 태양에 가면 몇 년이나 걸린다고?” 하지만 정작 아이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흙에 대해 설명해주는 캐릭터 두더지 옆에 조그맣게 그려진 개구리를 찾느라 책을 읽어줘도 듣는 둥 마는 둥이다. 태양에 대한 책에서는 선글라스를 낀 고양이가 우습다고 깔깔 댄다. 아이는 책의 내용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기억해내는 것도 거의 없다. 아, 나는 책을 왜 읽어주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쿵푸팬더3>을 보면서 깨달았다. 사실 <쿵푸팬더> 시리즈는 무술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 ‘배움’에 대한 이야기다. <쿵푸팬더1>도 마찬가지다. 타이거리스, 멘티스, 멍키, 크레인, 바이퍼는 모두 스승 시푸에게 무술을 정통으로 ‘배운 자’들이다. 시푸의 수제자였지만 지금은 악당이 된 타이렁은 이들 무적의 오인방을 제압한 후 이렇게 말한다. “시푸에게서 제대로 배웠구나” 타이렁은 스승 시푸를 죽이려 하면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배운 대로 했다. 그런데 나는 왜 용의 전사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외친다. 시푸, 타이렁, 무적의 오인방, 이들은 모두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배움에 집착하는 이들이 그토록 되고 싶어 하는 용의 전사로, 무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배운 적이 없고 몸도 무거워 배우기도 힘든 팬더 포가 지목된다. 타이렁에게 필살기인 손가락 기술을 걸자 타이렁은 포에게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 시푸가 가르쳐줬을리 없다”고 말한다. 그 질문에 대해 포에 대답은 이렇다. “나 혼자 깨우쳤지롱~”
그러니까 포가 용의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아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배워서 깨닫는 자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능력’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용의 전사만이 가질 수 있는 용의 문서에는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용의 전사는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일까? <엉망진창 흙>을 읽으면서 아빠는 ‘가로세로 1미터 크기의 땅에 300만 마리가 넘는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배움이라고 믿지만, 아이는 이 책을 통해 전혀 다른 것을 배운다. 장난스럽게 그려진 개구리를 찾으면서 개구리는 흙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흙이 없어지면 더 이상 개구리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아빠는 글만 읽었지만 아이는 이미지에서 새로운 발견을 한 것이다.
<이글이글 태양>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을 아이에게 수차례나 읽어주었지만 이 책에서 태양을 소개하는 동물이 고양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내게는 자동차로 태양까지 가려면 177년이 걸린다는 정보가 중요하지만 아이는 태양을 소개하는 책에서 왜 고양이가 나왔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해가 있는 낮보다는 밤에 더 시력이 좋은 고양이야말로 이글대는 태양을 소개하기에 적합한 동물 아닌가.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페이스북의 친구가 자신의 일곱 살 아이가 수학 퀴즈를 좋아한다고 적었다. 그 아이는 자동차 번호판의 네 자리 숫자 각각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아빠가 정해준 숫자를 만드는 게임을 즐긴다고 했다. 글을 읽고 생각이 많아진 나는 더하기, 빼기도 능숙하지 않은 아이를 앉혀 놓고 하루아침에 구구단을 5단까지 외우게 만들었다. 구구단을 제법 외우는 아이를 보고 수학 공부에 불이 붙은 나는 집에 쌓아둔 수학 문제집도 아이를 앉혀 두고 모두 풀게 했다.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아이는 이제 자기도 구구단을 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아이에게 수학 머리가 영 없진 않구나 안도하는 사이 엄마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4에서 8을 곱하면 왜 32인거야? 곱한다는 게 뭐야?”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다시 물었다. “2에서 5를 곱하면 왜 10인거야?” “몰라. 그냥 아빠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
어른들의 관점에서야 아이들이 푸는 수학 문제는 너무 단순하지만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다. 아이 스스로 문제를 읽고서 거기에 제시된 방식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 답을 하기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나는 아이가 문제를 읽고 패턴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답을 찾는지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 원리를 찾을 시간도 주지 않았고 유치한 시기심에 요령부터 가르쳤던 것이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스스로 패턴을 찾고, 그림을 이해하고, 배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만 했다. 이야기의 빈틈을 아빠의 설명으로 채우지 않고 빈틈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아이에게 빈틈을 채울 기회를 주는 것이다. 조바심에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아이에게서 스스로 발견하는 기쁨을 빼앗게 된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하다. 왜 인어공주는 거품이 되는 것을 선택했는지, 태양의 흑점이 무엇인지, 고릴라가 어째서 아빠를 의미하는 것인지 당장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고, 아빠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움베르트 에코는 “신은 달팽이 같다”고 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메시아가 오기까지 왜 그토록 긴 시간이 필요했단 말인가.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 더딤을 인내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내 아이의 더딤을 답답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그 더딤을 기다리려는 초조한 몸부림을 거듭하고….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무지한 스승>에서 이렇게 말한다. “설명자가 무능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아이에게는 ‘설명하는 아빠’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책을 설명 할 만큼 똑똑한 아빠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책을 읽어주는 아빠, 기다려주는 아빠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Copyrights(c) 2009~2016 <웹진 아이사랑> All Rights Reserved. 웹진 아이사랑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도용이나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